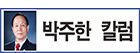-
 [선데이뉴스신문 양태호 칼럼]1998년 여름이었을 것이다. 당시 나는 철원지역의 전방 수색대대장이었고. 하루는 사단의 작전참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나의 대대장 전임자였고 성당의 신자였다. 사단의 신부님이 쌀 한 가마 정도 필요하다니 부대에 남는 쌀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태호 칼럼]1998년 여름이었을 것이다. 당시 나는 철원지역의 전방 수색대대장이었고. 하루는 사단의 작전참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나의 대대장 전임자였고 성당의 신자였다. 사단의 신부님이 쌀 한 가마 정도 필요하다니 부대에 남는 쌀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었다. 방학이라 서울에서 신자 학생들이 전방의 부대 성당을 방문하여 1박 2일 수련회를 갖기에 쌀이 많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신부님은 별생각 없이 신자인 작전참모에게 부탁하였고 참모는 같은 신자이고 후임자인 나에게 요청한 것이다.
난감했다. 부대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전임자의 부탁이었고 나 또한 천주교 신자인데 흔쾌히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부대에 남는 쌀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사실 쌀은 남아돌아 문제였으니. 하지만 남는 쌀이라고 지휘관 맘대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성당의 '쌀 손님'이 병사들이었으면 그래도 덜 고민했을 것이다. 어차피 병사들 먹일 쌀인데 우리 부대 병사가 아니라도 남는 쌀 줄 수도 있지. 그런데 병사가 아니라 학생이라면...
지휘관의 재량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신부님께 전화해서 사정 얘기를 하고 '못 주겠다' 하자니 나의 난처함을 신부님께로 되돌리는 것 같고. 이런 사정 고민 없이 부탁한 전임자 사단 참모가 야속했다,
결국 아내와 상의하여 농협에 가서 쌀 한 가마를 사와 성당에 보내 주었다. 헌금한다는 생각으로. 보내면서 부대의 남은 쌀이 아니라 내 개인 돈으로 산 쌀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되풀이 될 것 같아서....
하기사 우리 부모님도 우리가 집에서 먹는 밥은 부대에서 공짜로 쌀을 가져와 지어 먹는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오해는 신뢰에 금을 가게 하고 신뢰가 깨지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